"대학, 전공·기초학문 공부 제대로 안 시켜"
"대학, 전공·기초학문 공부 제대로 안 시켜"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 '한국 대학교육' 비판
"경쟁하지 말자니…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나"
건전한 시민 기르는 데는 평준화교육 필요하지만
영재급 리더 못 키우면 글로벌 무대에서 낙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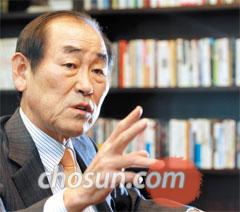
▲ 윤종용 회장의 교육관은 잘 정리돼 있었다.
평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주변에선
전했다. 원래 개별 언론 인터뷰에 잘 나오지
않지만, 질문을 교육 이슈에 국한한다는 조건
을 달아 어렵사리 응낙을 받아냈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65·삼성전자 상임고문)은 교육문제에 생각도, 할 말도 많은 것 같았다. "대학이 전공 공부를 적게 시킨다"고 대학 교육을 겨냥했고, 교육좌파의 평준화 지상론에 대해선 "경쟁하지 말자니,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업들의 봄 채용시즌, 윤 회장을 인터뷰한 것은 기업 관점의 교육론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기업은 학생·학부모와 함께 공교육의 최대 수요자 중 하나다. 학교가 배출한 인재를 데려다 쓰는 기업이라는 '고객'은 교육에 무얼 기대하고 있을까.
윤 회장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전공과 기초학문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인도공과대학(IIT)은 전공 중심으로 180학점을 따야 졸업하는 것으로 안다. 반면 우리 대학은 120학점 정도만 따면 졸업시켜준다고 한다. 공학 같은 응용학문을 하려면 전공과 기초학문 실력이 튼튼해야 하는데, 대학이 충분히 가르치질 않는다."
윤 회장은 작년 5월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물러난 뒤 공학인재·기술 양성을 지원하는 공학한림원 일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글로벌 톱에 올려놓은 세계적 경영자인 그는 교육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글로벌 시대엔 세계가 경쟁하면서 발전한다. 세상에 우리뿐이라면 평준화해도 된다. 하지만 유엔 가입국만 해도 192개나 된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 거라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데, 우리만 경쟁을 시키지 말자고?"
―그래도 여론 조사를 해보면 평준화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사회를 지탱하는 건전한 시민을 기르는 데는 평준화 교육이 맞다. 하지만 발전하려면 리더와 전문가가 필요하고, 평준화만으론 안 된다. IQ 150의 영재를 IQ 100에 맞추자는 것은 평준화가 아니라 역차별이다. 각 분야의 영재급 리더를 키우지 못하면 글로벌 무대에서 낙오하는 거다."
―평준화가 가져다준 장점도 있지 않은가.
"내 말은 평준화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다. 건전한 시민을 기르는 평준화의 전체 틀은 유지하되, 소수 영재를 키우는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다. 평준화를 깨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탈피하고 극복하자는 것이다."
―중·고교 교육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중·고교에선 가르치는 과목 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잡다한 과목을 모조리 가르치면서도 정작 필요한 기초 교과는 제대로 안 가르친다. 입시부터 잘못됐다. 수학·물리의 기본도 모르는 고교생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공대에 들어가니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는 "언젠가 국내에서 공부한 박사는 '서해안 꽁치', 미국서 공부한 박사는 '태평양 참치'라고 했다가 욕을 얻어먹은 일도 있지만…"이라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욕먹어도 할 말은 하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는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밖에 나가 글로벌하게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는 창의적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연어 새끼를 동해에 방류하듯, 큰물에 가서 배우라는 것이다."
윤 회장은 요컨대 상위 1~2%의 영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에 국가 발전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년 전쯤 부산 영재학교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런 영재학교 5개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5개냐고? 한 학교당 200명씩 1년에 1000명의 영재만 길러내면 30년이면 3만명이 양성된다. 이들 중 절반이라도 각 분야 리더·전문가로 포진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영재교육을 할 만한 영재풀은 충분한가.
"한국인의 IQ(지능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10년 전쯤인가, 일본 굴지 기업의 CTO(최고기술책임자)가 한국이 부럽다며 하던 말이 기억난다. '일본엔 영재급 인재가 수천 명 정도인데, 한국엔 2만명은 있다'는 것이었다. 자기들 나름대로 분석해본 모양이었다. 이런 영재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해줘야 나라 전체가 발전한다."
(인터뷰 후 윤 회장은 비서를 통해 스위스 취리히 대학이 조사한 각국의 평균 IQ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IQ가 107로 1위이고, 한국은 106으로 세계 2위였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입학사정관이 우수하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문제점도 많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부정할 게 아니라 보완해가면 된다."
그는 도구와 과학기술의 혁신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기술 사관(史觀)'의 신봉자다. 그 자신도 공대(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인 윤 회장은 '의대 쏠림' 현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은 의대·한의대로만 몰리는데.
"(의대·한의대에 몰리는 학생들이)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당장 인기 있는 곳,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같다. 지금 의대 들어가는 많은 사람은 나중에 개업은 고사하고 병원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공계에 가면 미래에 희망이 있나.
"인류사(史)는 도구 발명의 역사다. 원시도구가 농업혁명을, 기계도구가 산업혁명을, 디지털도구가 디지털혁명을 가져왔다.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게 뭔지 구체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공학과 과학이 만들어 낼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교육에 달렸다면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와의 대화를 소개했다.
"나이스비트와 만난 자리에서 '미래가 뭐냐'고 묻자 '미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 '그럼 교육은 뭐냐'고 되묻자 '교육이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to learn how to learn)'이라는 것이었다. 이게 핵심이다. 단편적인 지식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배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우리의 공교육은 지식 암기에 치중하는 것 같다."
―교육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갈랐다는 것이 지론이신데.
"산업혁명은 영국이 시작했지만 국민이 나태해지고 공학 교육을 경시했기 때문에 패권을 일찍 넘겨주었다. 상류층 중심의 관료 교육에 치중하고 공학 교육엔 소홀한 것이다. 그 사이 독일·프랑스는 국가가 나서 공대를 설립해 엔지니어를 키우며 급성장했다. 미국은 더 적극적이어서 특허 개념을 헌법으로 보호했다."
윤 회장은 "결국 실용적인 공학·기술 교육이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융성하게 해줄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