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亞) 소수민족 찾아다니며 학자들이 '한글 세계화'
'글 없는 백성 어엿비…' 세종의 뜻, 세계에 펼치다
이한수 기자 hslee@chosun.com
"로마 문자보다 우수하다"
아(亞) 소수민족 찾아다니며 학자들이 '한글 세계화'
정부차원 총괄단체 절실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에게 한글을 표기수단으로 전파하는 운동은 민간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전개되어 왔다.
이현복(73)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글 해외전파'의 개척자이다. 이 교수는 1994~2003년 매년 두세 차례 태국 북부의 소수민족인 라후(Lahu)족을 찾아 한글을 전파하는 활동을 펼쳤다. 처음 5년은 라후어의 음운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연구했고, 이후 산골마을 사람 20여명을 대상으로 라후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우리말 발음에 없는 목젖소리나 콧소리 등을 표기하기 위해 한글 자음과 모음을 24개에서 80개까지 늘린 '국제한글음성문자'(IKPA·International Korean Phonetic Alphabet)도 개발했다.
이 교수가 한글 해외전파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영국 런던대에 유학하던 1960년대부터였다. 그는 "로마자를 뿌리로 하는 국제음성기호(IPA)보다 한글이 훨씬 뛰어난 음성체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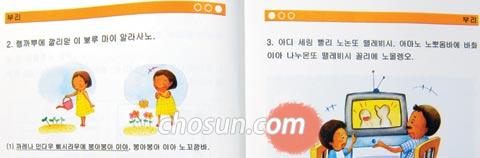
- ▲ 훈민정음학회가 찌아찌아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 ‘쓰기’(부리) 교재. 왼쪽 위에 한글로 적은 ‘렝까뿌에 깔리맏 이 ??루 마이 알라사노’라는 문장은 ‘아래의 빈칸을 이유와 함께 완성하라’는 뜻이다. 오른쪽 위의 ‘아디 세링 빨리 노논또 뗄레??시…’는 ‘아디는 텔레비전을 자주 아주 많이 본다’는 뜻이다./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
한글 해외전파는 이후에도 학자들 차원에서 아시아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이어졌다. 전광진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소수민족인 '로바족'(2002년)과 '어웡키족'(2008년)의 언어를 한글로 적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북대 연구팀은 한글로 동티모르 민족어인 '떼뚬어'를 표기하는 연구를 했다. 김석연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는 네팔 오지 마을의 언어를 한글로 적기 위해 몇년 동안 노력했다. 이번에 찌아찌아족에 한글 교과서를 만들어준 이호영 서울대 교수도 2004년 중국 흑룡강 유역의 소수민족인 '오로첸족'에게 한글 전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학자들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지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적이었다. 이호영 교수는 "중국 오로첸족에게 한글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한글 해외전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현복 교수는 "개인 차원으로 한글을 보급하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 아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경우에도 지속성을 갖고 한글이 정착되려면 상주 교육인원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직 '한글 해외전파'를 총괄하는 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4~5년 전 한글 해외전파를 총괄하는 단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현재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의 언어는 전 세계에 66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네스코 후원을 받는 국제단체인 SIL(하계언어학교)은 사멸 위기에 있는 종족의 언어에 로마자 기반의 문자를 보급하는 '바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SIL은 1934년 창립 이래 중남미·호주·서남아시아 등 2550개의 소수민족 언어를 연구해왔다.
전문가들은 한글이 영문 알파벳 못지않게 소수민족 언어 표기 수단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전광진 교수는 "한글이 어느 문자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글이 한국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